한강(Han Kang)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Red Anchor)」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묵직한 주제 의식으로 국내 내로라하는 문학상을 수차례 받으며 주목받아 온 이 작가는 매 작품마다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한국 문학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며, 2024년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2024년 12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한강은 비극적 상황과 마주한 인간의 고투와 존엄을 유려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그려내는 작가다.
ⓒ 연합뉴스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에 자국민의 수상을 바라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집착은 별스러운 구석이 있다. 유난한 교육열과 성취욕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은 어쩌면 그 연장선에서 노벨상 수상을 염원하며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노벨상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지명도가 높고 대중적 관심이 쏠리는 평화상과 문학상에 대한 열망이 특히 높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갈증은 가셨지만, 한국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노벨 문학상을 다음 목표로 삼아 왔다.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가 각각 1968년과 1994년에 이 상을 수상하고, 중국 작가 모옌이 2012년 수상자가 되면서 노벨 문학상을 향한 한국인들의 기대 심리는 한층 커졌다. 한반도와 근접한 두 국가의 작가들이 이 상을 품에 안게 되자 어쩐지 노벨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한 느낌과 더불어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문학적 성취에 부러움과 질투가 뒤따랐다. 노벨상으로 상징되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민간 기관인 대산문화재단과 국가 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이 오랫동안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과 해외 출간을 지원해 온 것은 그런 배경에서였다.
역사적 트라우마
마침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한국 작가 한강을 호명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요 숙원의 달성이었다. 한국인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원어로 읽는다”는 말로써 한국 문학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한강의 노벨상 선정 발표 시점에 그녀의 소설들은 28개 언어권에 걸쳐 82권이 번역 출간되었다. 이 통계는 앞서 언급한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이것은 스웨덴 한림원이 밝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사유다. 이 기관이 한강의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덧붙인 자료에는 이렇게 좀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강의 작품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양적 사유와 긴밀하게 연결한다. 한강은 역사적 상처들과 보이지 않는 제약들에 작품으로 맞서며 매 작품마다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한강은 현대 산문의 혁신자가 되었다.”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대로 한 고투는 한강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두 장편 『소년이 온다(Human Acts)』(2014)와 『작별하지 않는다(I Do Not Bid Farewell)』(2021)는 각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Gwangju Uprising)과 1948년 제주 4․3 사건(Jeju uprising)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을 소재로 삼아 그 사건들이 개인에게 가한 폭력과 상처를 특유의 시적인 문체에 담은 작품들이다.

2024년 노벨상 시상식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한강 작가가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린케비(Rinkeby) 지역의 다문화학교에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 Nobel Prize Outreach, Photography by Nanaka Adachi
한강은 등단 초기에는 주로 개인의 슬픔과 실존적 고통을 즐겨 다루었고, 2007년에 낸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에서는 육식 문화와 가부장제 같은 사회적 차원의 억압과 폭력을 문학적 도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작품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주인공 영혜를 둘러싸고 영혜의 남편과 아버지, 형부 등이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사코 육식을 거부한 채 차라리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영혜의 모습을 통해 폭력의 본질과 위험성을 환상적 필치로 그렸다. 데버라 스미스가 번역한 이 소설의 영어판이 2016년 세계적 권위를 지닌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강은 일약 글로벌 작가로 떠올랐다.
이어서 영어로 번역된 소설 『흰(The White Book)』이 2018년 다시 한번 같은 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고, 2023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근원적 질문
한강의 주제 의식은 개인의 아픔에서 사회적 억압 쪽으로 나아갔으며, 여기에서 다시 역사적 차원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증언이 있다. 문학평론가인 정과리(Jeong Gwa-ri)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결정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무렵 대학원 제자였던 한강이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러했다.
“앞으로 다큐멘터리 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러한 발언 이후에 쓰였다는 점에서 정 교수의 증언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물론 두 작품이 비록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삼기는 했지만,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와는 거리가 멀고, 어디까지나 문학적 가공과 형상화를 거친 작품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승화의 바탕에는 아무래도 해당 사건을 기억하고, 유예된 애도를 이어 가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소년이 온다』의 중심 인물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학살에 희생된 열다섯 살 소년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 그 누나 정미이다. 그런데 동호와 정대의 주변 인물 중 살아남은 이들이 화자가 되어 당시 상황과 이후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일차적 동기가 기억과 애도라는 것을 알게 한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는 작품 속 유명한 문장에 그 동기는 시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 문장의 일인칭 대명사는 일차적으로는 동호와 함께 도청 상무관에서 시체 수습 일을 했던 은숙을 가리키지만, 그녀 말고도 사태에서 살아남은 다른 이들, 더 나아가서는 소설을 읽는 모든 독자들 역시 그 범주에 포함될 만큼 보편성을 지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사 쿠데타와 폭력 사태를 경험한 튀르키예나 아랍 독자들이 이 소설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었다는 독후감이 그 점을 확인시킨다.
『소년이 온다』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폭력과 저항, 희생과 기억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어 세계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소설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것이 이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더 높인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설에 삽입된 이 문장은 광주 5․18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한 대목에서 출발해 스페인 내전과 아우슈비츠, 보스니아 학살 등 인류사의 비슷한 경험들을 관통하는 근원적인 질문이라 하겠다. 한강은 자신의 소설을 가리켜 ‘질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소년이 온다』를 읽는 일은 독자들이 소설 속 질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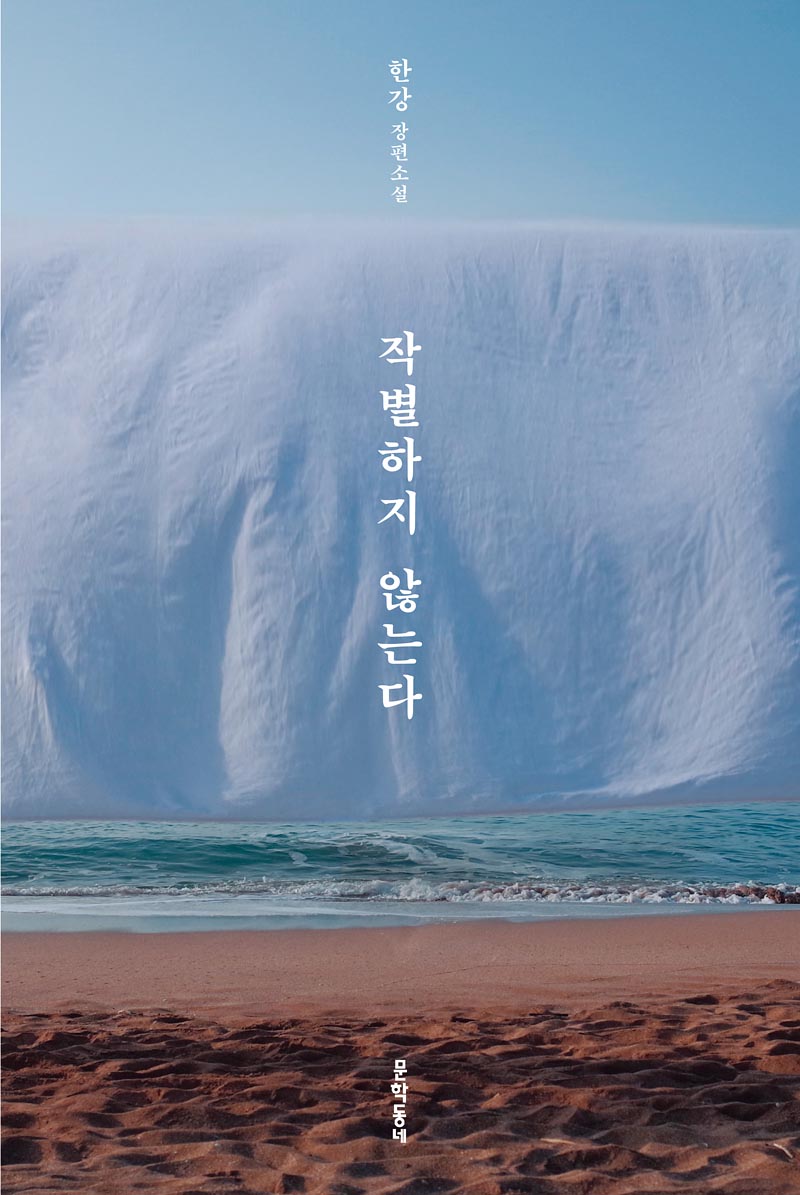
2021년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 표지.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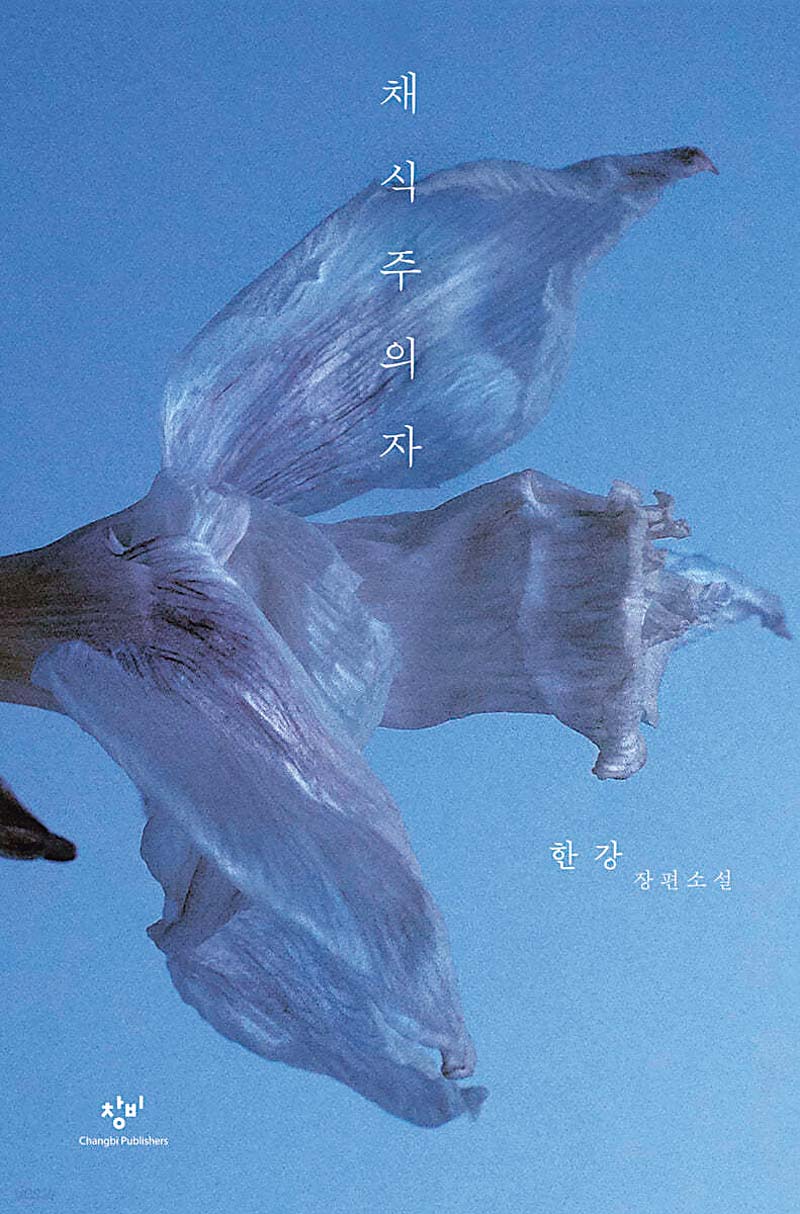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입지를 한 단계 확장한 소설 『채식주의자』. 2024년 출판사 창비가 출간 15년 만에 새로운 장정으로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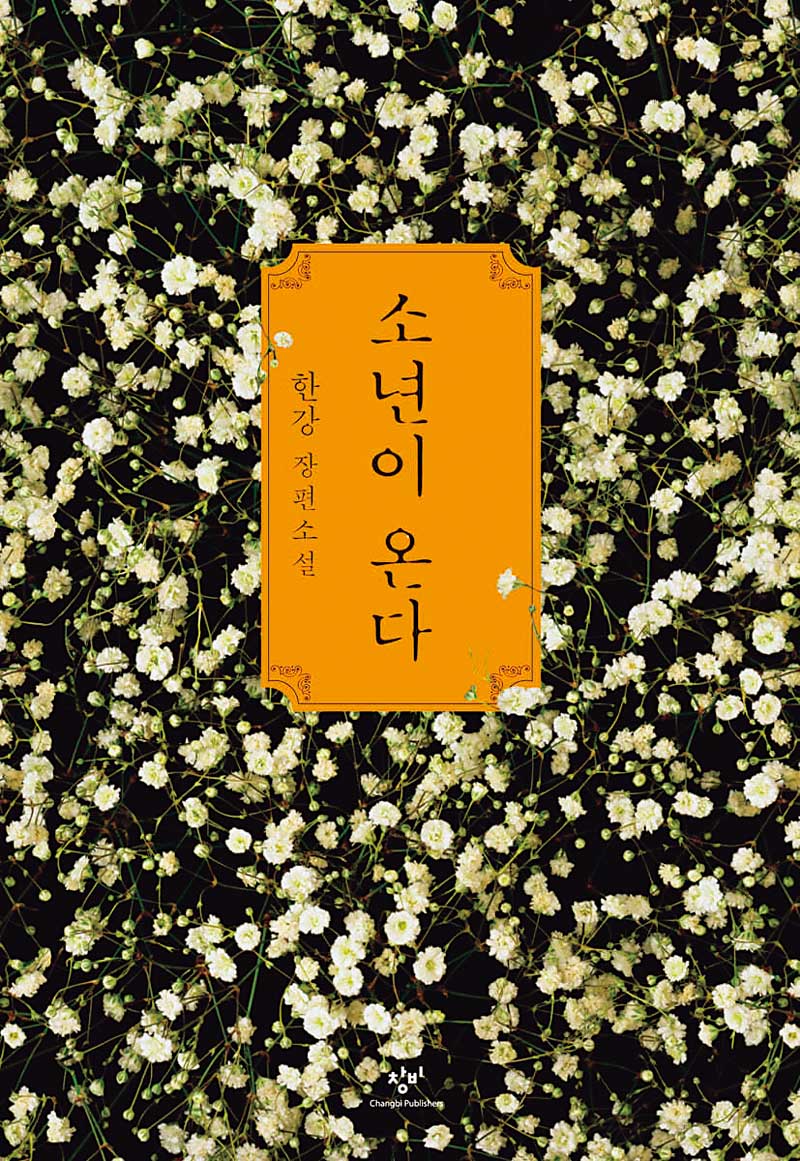
2014년 작 『소년이 온다』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고,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다.
공감과 실천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루었다. 작품 앞부분에서 소설가로 등장하는 경하는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뒤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소설은 경하와 시각 예술가 인선의 우정에서 출발해 인선의 어머니 강정심의 투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간다. 강정심은 제주 4․3 당시 잡혀가 실종된 오빠의 행방을 찾고자 평생을 분투했는데, 독자들은 그 과정에서 연약한 한 여성이 강인한 역사적 주체로 부각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이 세 작품과 함께 2011년 작 『희랍어 시간(Greek Lessons)』이 비교적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있는데, 힘든 일을 겪으며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여성과 점차 시력을 잃어 가는 남성이 서로의 취약점을 알아보고 위안과 힘을 주고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소설 역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실천이라는 한강 문학의 큰 주제를 다루었다 하겠다.